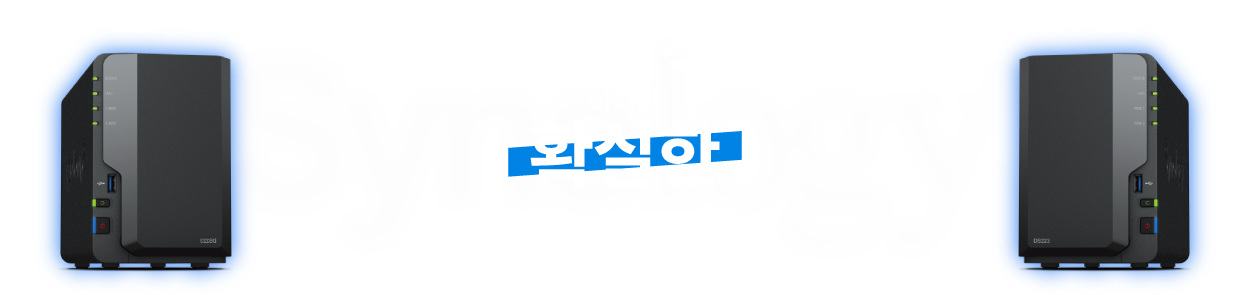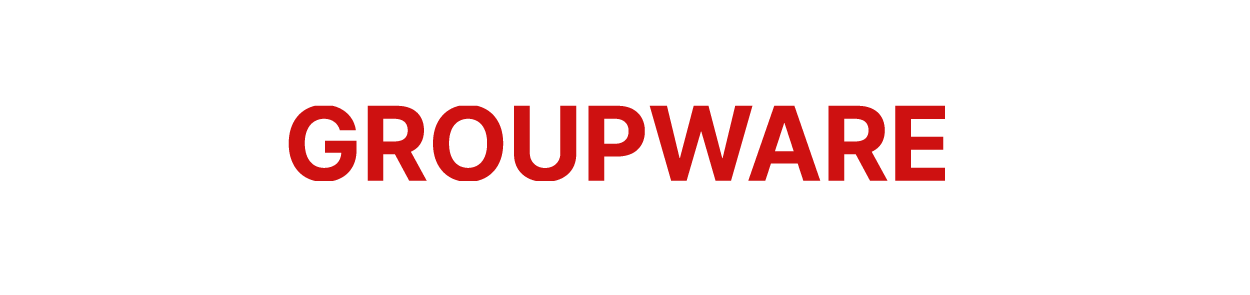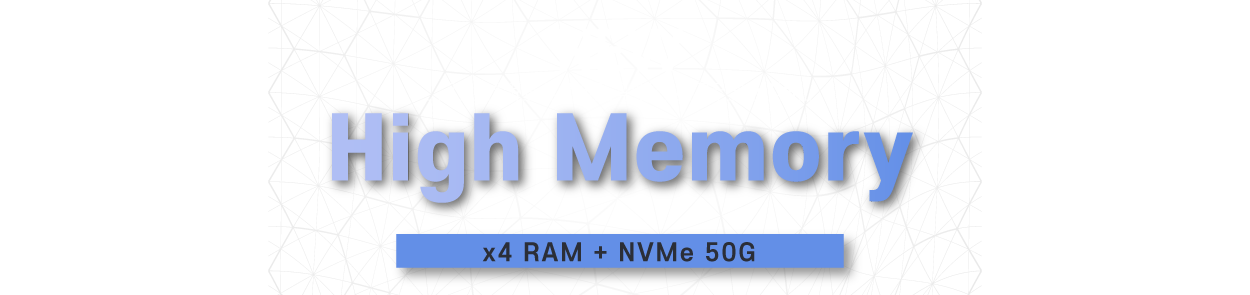어릴적 내 유년의 집 마당엔, 모과나무가 한그루, 담장아랜 무화과 열매가 익어가고..
엄마가 정성들여 가꾸던 화단엔 계절따라 작약, 수국, 나리꽃, 영산홍등이 곱게 피고,
은은하게 퍼지던 천리향 향기가 코끝을 맴돌곤 했었다.
비오는 날이면 댓돌위 마루에서 발을 대롱거리며 앉아 빗소리를 하염없이 듣던 사춘기 시절..
줄줄이 동생들 도시락까지 아침이면 부엌에서 몇개씩 도시락을 싸던 엄마의 모습도 떠오른다.
분홍소세지, 쥐포채 볶음, 계란말이, 볶은김치, 콩자반, 다시는 맛볼수 없는 엄마의 도시락 반찬들..
그 시절의 기억은 수국이 활짝 핀 어느 절집앞에서, “만지지 마세요”란 글자와 함께
어느 휴게소에서 스치로폼박스에 곱게 담긴 무화과열매등을 볼때 문득문득 아련하고 그립다.
마당있는 집에서 살고 싶었다.
딱 식구들 먹을만큼의 텃밭을 가꾸면서 볕좋은 날은 이불도 널고 빨래도 뽀송뽀송 말려가면서..
하지만 현실은 회사를 다니며 일을 해야하고, 딸아이는 이제 중학생이며, 이런저런 상황및
편의를 고려하면서 전원 생활을 하기엔 여러모로 쉽지 않았다.
가까운 지인중엔 용인근교에 살면서 마당있는 집에서 텃밭농사를 지으면서 전원생활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 친구도 있기는 하다.
그집 앞마당 텃밭이다. 십여종 이상의 텃밭작물을 키우고 있다.
좋아하니까 가능한 일이다.
얼마전 아파트 생활을 청산하고 이사를 했다.
옥상이 있었고, 소일거리로 마당대신 쪼그만 옥상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두어평남짓한 텃밭에 상추, 비트, 가지, 고추, 토마토, 딸기모종을 몇개 사다 심고,
강낭콩 씨앗도 뿌렸다.
볕이 좋고.. 올여름 가뭄에도 꼬박꼬박 물을 잘줘서인지 하루가 다르게 잘 자라줬다.
상추, 깻잎은 작은공간에서 솎아내기가 바쁘게 올라왔다.

쌈채소를 따서 고기도 구워먹고, 차한잔 들고 올라가서 해질녘 서늘한 바람을 맞는것도
소소한 즐거움이 됐다.
주말에는 한동안 못나간 캠핑대신 릴렉스 체어에 앉아 예전에 읽었던 셜록홈즈 시리즈를
다시 읽기도 한다. 평상이 하나 있었음 좋겠다.
얼마전 블루배리 모종을 사서 심었다. 얼만큼 잘자라 줄런지는 모르겠지만..
새순이 자라고, 보라빛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길 기대한다.
마당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나름 괜찮다.
한바탕 비가 쏟아진 뒤 보랏빛 가지는 따먹기가 바쁘게 주렁주렁 열리고,
고추는 알싸한 매운맛이 더해졌다.
옆지기는 시원한 맥주한캔을 하고, 그옆에서 나는 늦깍이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한다.
더위가 한숨 가신 여름날 저녁.. 우리집 풍경이다.